
“노오란 눈빛들이/ 수 천 개의 함성을 달고/ 광장에 나서면/ 너는 흐느끼는 강물이 된다/ 쏟아지는 폭포가 된다/ 소리없는 분노를 끌고/ 지구가 닿을 수 있는 행성마다/ 불을 지피고/ …작고 어두운 방에서/ 몸을 태워/ 빛이고자 했던 꿈들이/ 종이컵 안에다 세상을 가두고/ 내 몸까지/ 저리 흔들고 있구나.” 정군수 시인의 ‘촛불시위’중 일부다.
지난해는 유독 촛불시위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시인은 자신의 소리없는 분노를 시심에 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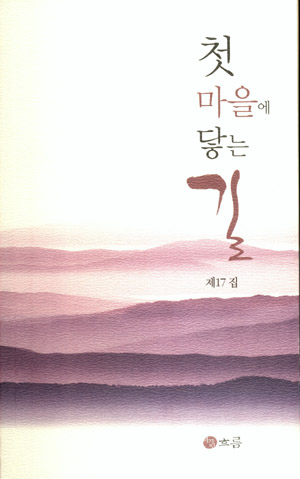
김남곤 시인을 비롯 이동희 소재호·진동규·조기호·정군수·정희수·안평옥·최만산·박석구·문금옥·김영·유인실 시인 등 전주에서 내로라하는 시인 25명이 참여하고 있는 ‘풍물시동인회’. 그답게 17번째 사화집에도 눈에 띄는 시들이 많다.
“갑자기 양철 지붕위로 수십마리 고양이들이 뛰어갑니다/ 낮아진 먹장 하늘가에 방죽 잠자리 우왕좌왕/ 번쩍 백만촉 전구가 켜졌다 꺼지더니/ 후두둑 졸고 있던 호박잎이 기겁을 합니다/ 흙냄새 진한 으스스한 바람이 동네를 휘돌고서야/ 해가 빼꼼 눈치를 보는 칠월 오후녘 모정/ 초복 낮술에 취한 아버지 세상 모르게 코를 고는….” 어떠신가. 칠월 초복더위로 나른해질대로 나른해진 세상에 한줄기 소나기가 퍼붓고 가는 풍경에 감칠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 박철영 시인의 ‘소나기’는 대설추위도 물러가게 할 만큼 입맛이 쩍쩍 다셔진다.
그 뿐 아니다.
소재호 시인 ‘능소화’는 또 얼마나 봄날의 가뿐 함성을 뿜어내는지 그 묘미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스스로는 자리를 자꾸 내어주는/ 경쾌한 낙화./ 그러나 다시 관절의 시린 마디마디에/ 황금빛 꽃을 차곡차곡 매단다.
/ 드디어 전신을 빛내며 치렁치렁/ 꽃을 들어올리는 영혼….” 역시 그림 그리는 시인답게 능소화 꽃의 화려한 자태를 만끽하고도 남음이 있잖은가. 이처럼 ‘첫 마을에 닿는 길’에는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정취가 그득하다.
그뿐 인가. 시사성도 빼곡하다.
25명 시인이 그려내는 세계는 기축년의 훈훈한 첫 마을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김영애기자 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