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름한 시장통-시골 골목길-들꽃등 평범한 일상의 풍경 독자 시선 사로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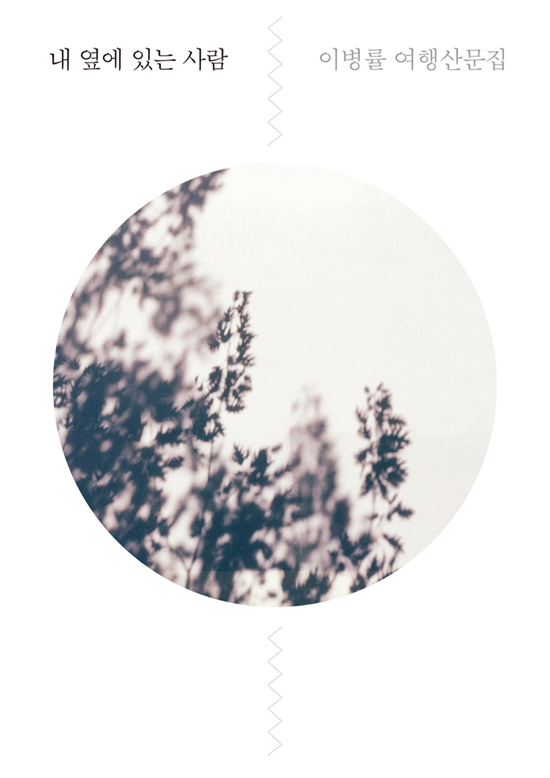
‘끌림’이 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2015년, 이병률 시인이 새로운 산문집을 선보인다.
지난 2012년에 펴낸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후 3년 만의 신작이라 더욱 반갑다.
‘내 옆에 있는 사람’(달)이라는 다정한 제목의 이번 책은 여행산문집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그가 만났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과 기억에 관한 기록이 주를 이뤄 사람 냄새 나는 책이 됐다.
시인이 그간 출간했던 ‘끌림’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가 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을 종횡무진 다니며 이국적인 풍경을 담아낸 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국내편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다닌 곳이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도에 이른다.
그야말로 전국 8도를 넘나든 것이다.
산이고 바다고, 섬이고 육지고 할 것 없이 모두 작가의 발자국이 닿았다.
금발의 아리따운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대신, 허름한 시장통에 삼삼오오 모여 국수를 먹거나 작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들꽃들, 어느 시골 골목길에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들은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고개만 돌리면 만날 수 있는 주위의 풍경들은 평범하지만 작가의 산문과 잘 어울린다.
‘여행이란 여전히 풍경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라고 믿고 길을 떠났던 그의 눈엔 많은 것들이 펼쳐졌다.
전작에서는 주로 여행길에서 맞닥뜨린 한 장면을 영화의 스틸컷처럼 포착해 보여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장면의 앞과 뒤로 이어지는 서사에 집중했다.
‘보는’ 여행에서 ‘듣는’여행서로 전환한 것이다.
작가 스스로도 “많이 듣고, 끄덕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내면에 쌓이는 것들이 많았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장소에 다다른 그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 혹은 어느 한 사람의 뒷모습, 그 사람이 남기고 떠난 발자국, 그런 것들을 몰래 그리고 오래 들여다봤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계절만큼이나 뚜렷하게 서늘했다 뜨거웠다 이내 차가워지는 삶의 온도차를 느끼게 됐음을 책에 담아냈다.
그래서일까. 작가는 이 기행들을 굳이 여행으로 명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확장과 연장선으로 설명했다.
일상을 여행으로 여기며 사는 태도를 가진 자들의 모습을 통해 여행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목차가 따로 없다.
심지어 페이지도 없다.
굳이 어떤 편을 찾아 읽으려 하지 않아도 술술 읽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작가는 서로를 가늠하고 추측하는 과정 어딘가에 이 책이 놓여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에 존재하는 각각의 산문은 아주 평범한 일상 같기도 하지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만들어내는 굉장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책에 수록된 사진 절반 이상이 필름카메라로 찍은 것 또한 구수한 사람 냄새를 담고 싶었던 작가의 숨은 계산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면 독자들 역시 작가가 떠났던 여행길에 동행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은 여행엔 정해진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듯 하다.
/홍민희기자 hm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