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박신영 '이 언니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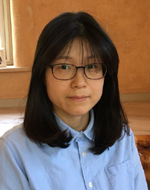
제목이 기억에 남아서 읽게 되는 책이 있다.
리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가 그런 책이다.
여성은 자라면서 사회적 통념과 관습 등으로 순진한 아가씨 배역을 자의든 타의든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회사나 조직에서 의견이 무시 돼도, 더 나아가 매를 맞아도 강간을 당해도 그것은 여자니까라는 인식과 맞서 싸워야 한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강요된 상식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내재화 되어 자신을 과녁에 겨누게 된다.
솔닛은 여자들은 이중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문제의 주제와 하는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말할 권리, 생각할 권, 인간이 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전선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중학교 때 첫 월경을 하고 세상은 그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전쟁 중에 여자들은 어떻게 생리할까?’와 같은 물음들이었다.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과 고난의 시간에 여자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문학동네)는 인터뷰의 기록이 아니라 논픽션의 형식으로 쓰지만 소설처럼 읽히는 다큐멘터리 산문이다.
2차대전시 러시아와 독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풀어낸 글이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감성과 시선으로 펼쳐지는 삶의 이야기가 가슴을 저릿저릿하게 했다.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이 책으로 2015년 노벨문학상을 탔다.
삼중당문고의 책을 보고 자랐다는 작가 박신영은 나와 비슷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글은 쉽게 읽히고 공감이 간다.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고민, 나는 왜 이럴까 할 때 <이 언니를 보라>(한빛비즈)를 보자. 옛날에도 지금 여자들이 겪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슬기롭게 헤쳐나간 언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서양 동화 속 왕자들은 엄청 잘 생긴 얼굴에 마음도 고우며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다.
빨간 구두를 신으면 계속 춤을 추며 돌아 다녀야 하고 또 마녀가 등장한다.
작가의 다른 책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닐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한다.
정사보다는 야사가 재미지고 이야기의 배경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책장이 후딱후딱 넘어갈 것이다.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디자인하우스)은 요리책이지만 예쁜 사진이나 사고 싶은 조리 도구가 없다.
먹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지도 않으며 조용히 내 삶을 바라보게 했다.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재료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모두 우주의 일부이니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살라고 한다.
과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과 간단한 조리법으로 누군가 요리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꼭 필요한 만큼의 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을 즐기라는 메시지는 내 맘에 꼭 든다.
재료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린 조리법이 소개 되지만 그렇게 조리 했다간 함께 사는 사람들의 원성에 못 견딜 것 같다.
이렇게 요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재료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입맛도 사라져 가고 있다.
게으르니 당연히 시간에 쫓기는 나는 오늘도 라면을 끓일 것 같다.
봄이니까 특별히, 저 혼자 씩씩하게 자란 두릅을 따다 넣어야겠다.
관련기사
- 독자의 서재 #11 우리를 행복하게 할 대선주자는 누구일까?··· '대통령의 조건'
- 독자의 서재 #10 "나를 되돌아 보게 하는 삶의 지혜 책 속에 있다"
- 독자의 서재 #9 "책은 가장 좋은 기억의 시간, 가장 좋은 위로제"
- 독자의 서재 #8 "나를 있게 해준 책, 그 책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파"
- 독자의 서재 #7 "사색 없는 지식으로 가득한 책장서 찾은 소소한 즐거움"
- 독자의 서재 #6 "책이 맛있다"··· 할머니-엄마의 모습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읽다
- 독자의 서재 #5 순수한 감성이 그리운 당신에게 드리는 '어린왕자'
- 독자의 서재 #4 "어린시절 밤을 새우며 책 읽던 기쁨, 독서 모임으로 되찾아"
- 독자의 서재 #3 어지러운 시국··· 충분히 슬퍼해야 슬픔을 넘는다
- 독자의 서재 #2 '현대세계걸작 그림동화'를 읽던 소년, 청년 조각가가 되었다
- 독자의 서재 #1 급속한 사회변화 속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