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중심의 역사관 흥미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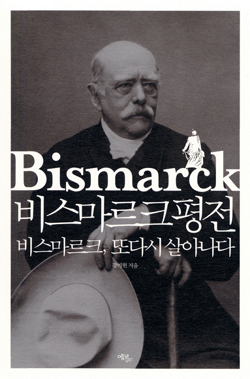
역사책을 읽다보면 저절로 생기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역에 물러나게된 그들은 그뒤 어떻게 되었을까?
위대하다는 ××가 그토록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데 어찌 맨날 경제공황 뒷수습만 했을까?
등등 문득문득 떠오르는 후일담에 대한 궁금증이나 당시의 여러 제반 사정들에 대해서 입니다.
가령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려면, 질좋은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의사 같은 전문 직종은 실력을 키워 서비스를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첫째이고요.
둘째는 아주 고전적으로 전쟁이나 약탈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보혁명 같은 혁신을 이루어 획기적인 발전이나 원가 절감을 이루는 것이죠.
현대 독일의 기초를 닦은 <비스마르크> 평전을 읽어보면 통치 기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경제 공황으로 고민합니다.
당시엔 철도가 등장하여 독일 전국에 철도 인프라가 깔려 물류 등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하고한날 생기는 경제 불황에 시달립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1890년에 그가 물러나고 얼마 후부터 1차 대전 전까지 호황을 맞이하는데, 자동차가 등장하는 대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90년대 부터 21세기 초까지 정보통신혁명이 마무리되고 한동안 불황이었던 이유를 겨우 이 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호황은 경제혁명 때만 찾아온다는 것을...
1차대전의 도화선이 된 세르비아 청년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의 원인이 된 1878년의 베를린 회의 결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비스마르크>의 중재로 가뜩이나 영토가 많이 축소되어 이름만 남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선물처럼 넘어가는 과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하면 알게모르게 유럽사와 미국사를 중심으로, 특히 19세기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인 경우가 다수라서 독일인 중심으로 본 역사관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영미권에서 쓴 독일사와 독일인이 쓴 독일사는 많이 다르군요.
1차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호엔촐레른 황가의 <빌헬름 2세> 등의 운명도 간략하게 짚어 줍니다.
사실 검색하면 더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만 굳이 잠깐 의문을 가지고 마는 편이죠.
다수 역사서에서 더이상 주역이 아니면 간과되어 지는 경향이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전후 관계를 이처럼 세심하게 처리하는 책은 처음이라 좋았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고 사라지기 까지의 14년을, 현대 민주 국가 헌법의 원형이라할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 소멸까지 과정을 의미있게 되짚습니다.
우리의 통념과 달리 그들이 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 나라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였으나 태생이 왕당파와 자유주의자들의 불안정한 연합 체제라서 끝이 지리멸렬해진 것이죠.
가령 1차대전이 끝나자마자 <레닌>의 소련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새로운 선진 비밀무기를 시험해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은 것 등등.
저자가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1차 대전 이후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원인을 당시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1320억 마르크(현재 한국 가치로 3000조 원 정도)의 전쟁 배상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기술하는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배상금이 1320억 금 마르크로 1차 세계대전 직전 1달러 당 10마르크 였던 고정 환율로 설정된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르크가 아닌 금 마르크라 다르죠.
하이퍼인플레이션 할아버지가 와도 배상금은 차이가 없는 것인데요.
옥의 티라고나 할까요.
이 실수 하나를 뺀다면 19~20세기 독일 역사서로 가장 세심하고 치우치지 않은 명저입니다.
/박정민·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