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형식-색다른 시도 눈에 띄어 삶을 살아가는 이의 고민 고민에 위로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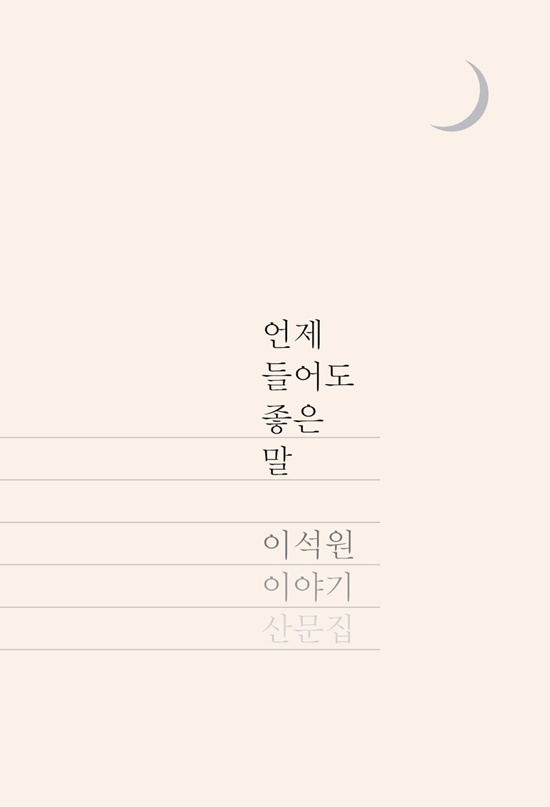
‘보통의 존재’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석원의 두 번째 산문집이 가을을 맞아 우리 곁에 다가왔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그책)이 그 주인공이다.
현실적인 소재로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그답게 이번 산문집 또한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싶은 이석원의 언어로 가득하다.
그의 대표작이자 첫 번째 산문집인 ‘보통의 존재’는 출간하자마자 연애와 결혼, 일과 미래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 젊은이들의 불안감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단숨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작가 이전에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그는 무엇을 만들든 전작과는 다르게 만드는 것을 창작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왔다고 한다.
그렇기에 ‘보통의 존재’와는 사뭇 다른, 그러나 이석원만의 개성은 살아 있는 전혀 새로운 산문집이 나올 수 있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은 형식과 내용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독특한 책이다.
여느 에세이처럼 짧은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 한 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긴 이야기를 품되 작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여 글을 전개해 산문집의 형태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석원의 글이 가진 특유의 흡인력과 속도감은 유지하면서 에세이 본연의 역할 또한 놓치지 않았다.
순간순간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길고 짧은 글들은 단순히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하고 쉬어갈 거리'를 준다.
사람과 삶, 사랑이라는 주제에 한결같이 매달려온 작가는 이번에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도구로 특별히 '말'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유난히 많은 ‘말’들이 담겨 있다.
언젠가부터 출판계에 불어든 새로운 바람은 에세이에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넣는 일이었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만큼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저자는 자신의 책만큼은 오직 활자로만 채워지길 원했다.
그는 표지의 작가 소개란에도 자신의 저작과 함게 ‘1971년 서울 출생’이라고만 이력을 적어놓았다.
이는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오로지 글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하는 듯 하다.
오랜 시간 글쓰기에 대해 고민을 거듭해 온 작가가 6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책은 이석원의 글이 가진 특유의 흡인력과 속도감은 유지하면서도 에세이 본연의 역할 또한 놓치지 않았다.
순간순간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길고 짧은 글들은 독자로 하여금 단순히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하고 쉬어갈 거리를 준다.
사람과 삶, 사랑이라는 주제에 한결같이 매달려 온 작가는 이번에도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표현의 도구로 특별히 ‘말’을 선택했는데 달콤하고, 때론 아프기도 하고 쌉싸래하기도 한 온갖 말들은 누군가에겐 언제 들어도 좋은 말들로 남을 만하다.
또한 작가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겪어내야만 하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책 한 줄 읽는 것도,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도 어려워 고통 받았던 시간에 대한 소회, 작가로서 생계를 잇는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 길이 과연 자신의 길이 맞는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어찌 보면 전작인 ‘보통의 존재’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던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그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명제에 대해 작가 자신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백 섞인 글을 통해 어쩐지 우리는 또 한번 위안을 얻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될는지 모른다.
다소 무거웠던 첫 산문집에 비해 그 무게를 덜어내려 애썼다는 작가는 변함없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제 우리가 ‘언제 들어도 좋은 말’로 화답해 줄 시간이다.
/홍민희기자 hmh@
